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IT 리더의 자리 by 마크 스워츠
부제 : 애자일 환경에서 CIO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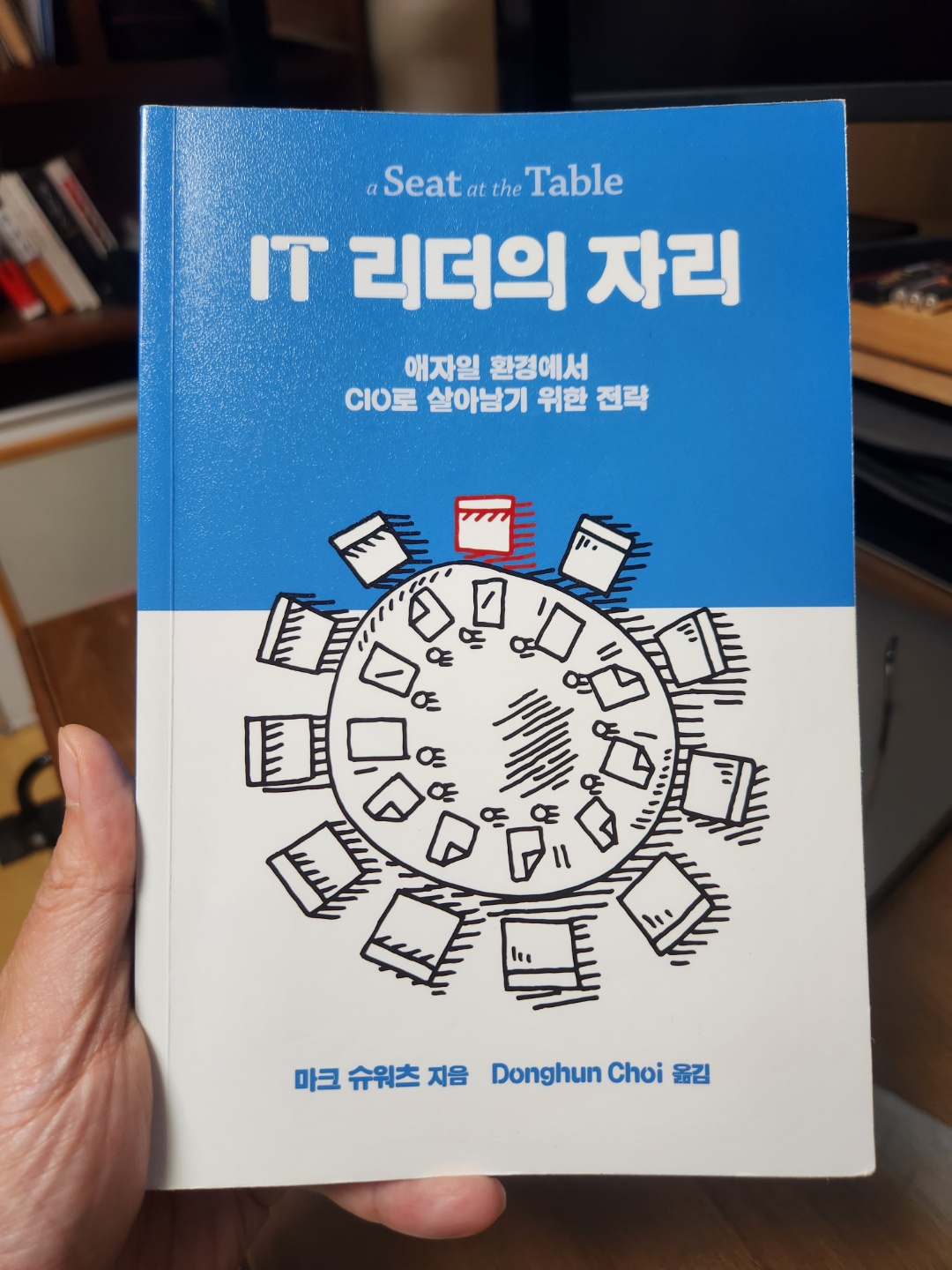
이 책을 읽게된 사연은 좀 독특해요. 함께 일하는 동료 후배가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완독하지 못하고 팀에 기부했고, 제목부터 나부터 읽어봐야 할 것 같은 내용이라… 이번 추석 연휴에 도전해 보았어요!
(이 책! 진심 캡짱 읽기 어렵습니다. 주제 자체도 말로 풀어내기 매우 어려운데… 문체, 번역, 책의 판형 등이 한층 더 책읽기를 어렵게 했어요.)
저자는 크게는 다음의 2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 IT와 관련된 기업은 일하는 방식을 워터폴에서 애자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으로 당연한 이야기
* 전통적인 워터폴 기반의 조직을 애자일 조직으로 변화시키려는 IT의 리더가 가져야하는 마음가짐의 변화 필요성
지금 알스퀘어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가지 고민 상황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던터라, 책을 읽는 내내 'IT 고수'로부터 멘토링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과 내가 선택한 방법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위안을 가지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었어요.
책에서 소개된 IT 리더로써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관련된 내용 일부를 발췌해 보아요! (편안한 이해를 위해서 문구 일부 조정했어요)
- ‘IT와 비지니스’라는 문구에는 ‘와’라는 접속사에서 보듯이 이 둘은 구분되며 별개라는 의미가 내포되있다. IT 조직이 존재했을 때부터 IT 조직을 괴롭혀온 ‘우리’와 ‘그들’이라는 인식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런 인식 속에서 더욱 더 기술 리더의 역할은 비지니스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술과 기술 조직 그 자체가 비지니스이기 때문이다.
- IT 기술리더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코 기회를 날려 버리지 않는다. 불확실성에 맞서 행동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IT의 핵심이다.
- CEO가 우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서 “어제 자네는 우리가 어쩌고저쩌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이거저거를 해야한다고 말하는 구만, 확실히 좀 해주겠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어제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저거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 편하게 하던 것을 얌전하게 한다고해서 테이블에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한다. 불확실성을 수용함으로써 그 자리를 얻는 것이다. 민첩성으로 불확실성과 협상하고, 기업을 위해 최선인 일을 수행함으로써 그 자리를 얻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일정, 무결성)을 통제하는 척함으로써 그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사전의 철저한 계획보다는 당면하게 될 어려움들을 용감하게 포용함으로 자리를 얻는 것이다.
이런 문구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 이제는 IT가 비지니스이고, 비지니스가 IT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IT=비지니스) 우리 주변을 점령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이를 설명하고 있고, 핀테크, 에듀테크, 푸드테크, 그리고 프롭테크까지… OO 테크로 증명되고 있지요.
-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IT팀과 비지니스팀은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에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하도급을 통해 솔루션을 납품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IT의 필요성이라고 믿고 있는 구식 사업 전략가, 사업 담당자들은 (최근 IT 업계의 경쟁력이라고 생각되는) '애자일', '스프린트', '자기조직적인 팀'과 같은 컨셉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단어들에게 때로는 위화감까지 느끼고 있지요.
- 위화감이 커져서 결국은 기분이 상한 사업 전략가들이 IT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업은 무늬만 OO테크가 되어 버리고, 조금 큰 전산실을 가진 전통 산업체의 위치에서 그다지 발전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 이런 불편한 상황은 구식 사업 전략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상황은 IT 리더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과 두려움에서 그들(사업전략가)의 시선에 맞춘 개발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 원인 중 하나이거든요. 좋은 표현으로는 비지니스 맞춤형 개발 조직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조직을 전산실이라 부릅니다.
- 말장난이겠지만 '(수동적인)전산실'을 '(자기조직적인)테크팀'으로 만들어서 기업의 비지니스 전반에 기여할 수 있어야, 나도 살고, 조직도 살고, 기업도 살게 된다고 생각해요.
- 이 어려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는 딱 한가지 단어가 가슴에 남네요. 그것은 ‘용기’ 입니다.
-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는 용감합니다!
반응형
'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I 2041'을 읽고 (리카이푸, 천치우판 저) (0) | 2024.02.09 |
|---|---|
| '도둑맞은 집중력, Stolen focus' 을 읽고 (1) | 2023.09.24 |
| '권력과 진보'를 읽고 (0) | 2023.09.03 |
| 독서 감상 - C레벨의 탄생 / 데이비드 푸비니 (0) | 2022.09.04 |




